
신간 <작가들의 우정편지>와 <그대 가슴 속에 살아 있고 싶다>(샘터. 2007)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사례다. 먼저 <작가들의 우정편지>는 국내 작가들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서간집이다. 소설가 박상우, 윤성희, 권지예, 백가흠 시인 이문재, 유자효, 이승하, 김선태 등 유명 작가들의 은밀한 사연들이 실려 있다.
이들의 주된 화두는 문학. 습작시절의 우정편지, 창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편지, 익명의 독자를 향한 편지가 등장한다. 여기에 작가들이 나눈 우정 이야기가 더해진다. 모두 하나를 뽑기 힘든 주옥같은 글이다. 그래도 소개해야 한다면 시인 이재무의 편지를 꺼내고자 한다. 그는 작고한 시인 박찬에게 이런 글을 쓴다.
“선배가 없는 세상 영혼의 공복과 해일처럼 밀려오는 적막의 시간 앞에서 우리는 버려진 고아처럼 그저 막막할 따름이어서 우리는 사나운 바람에 이리저리 불리고 쓸리는 가랑잎처럼 마음 정처 없습니다. 선배님! 살아서는 그토록 심상했던 선배의 너털웃음과 웃을 때 보이는 호수의 동심원처럼 잔잔하게 일어 퍼지던 눈가의 잔주름과 싯누런 이와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 물들인 머리칼과 줄 맨 안경과 헐렁한 멜빵바지 등속이 새삼스레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유행 지난 오버 깃을 세우고 인사동 거리를 지나던, 그림자처럼 걸어와 밥집으로 술집으로 자신들을 이끌던 박찬의 우멍한 눈결을 잊지 못하겠다고 우는 이재무의 글은 눈물로 가득하다.
이재무의 편지만 소개하기는 아쉽다. 소설가 강영숙에게 쓴 윤성희의 글도 숨기기엔 아깝다. 똑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중얼 거릴 때, 쪼그려 뛰기를 해도 개운하지 않을 때 “선배라면 어땠을까”라며 강영숙을 떠올린다는 윤성희. 글은 이렇게 끝난다.
“이 편지를 다 쓰면 술 마시자고 전화할게요. ‘이년아 넌 너를 너무 몰라’ 술 취한 선배의 목소리로 이런 욕을 듣고 싶거든요”
이렇듯 작가들의 편지는 솔직하다. 그 내면의 우물을 비춘 유려한 문체가 샘나도록 아름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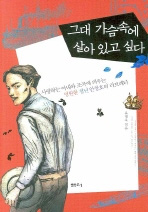
사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기구했다. 37년간 부부였으나 한 집에 산 것은 10여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이 편지 글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역자 윤병욱은 “당시 ‘나의 사랑 혜련’이라는 서두를 쓸 수 있는 도산의 사랑과 용기는 그의 남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도산은 서간에서 “하시옵소서” “바라나이다” “전하소서” 등의 표현을 썼다. 부부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이 같이 표현 한다.
“내가 일평생 당신에게 위로와 기쁨을 준 것이 없었고 이제 느지막이 와서 근심과 슬픔을 주게 되니 당신에게 미안함이 끝이 없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나를 위하여 우려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더욱 미안합니다”
수신자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편지는 일종의 ‘방백’이기도 하다. 이제 막 출간 된 두 서간집 또한 읽는 이 즉, 독자의 것이 된 셈이다. 외로운 가을을 겪는 독자라면 이 연서들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김민영 기자 bookworm@pi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