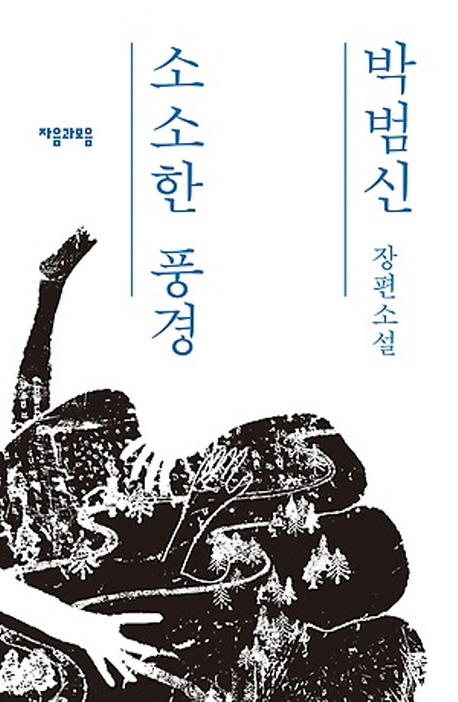
[북데일리] 저마다 비밀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이별이 그러하다. 비밀은 가시가 된다. 뽑아내야 할 가시라는 걸 알면서도 가시와 함께 살아간다. 가시를 숨긴 채 말이다.
박범신의 <소소한 풍경<(자음과모음. 2014)은 그런 가시에 대한 이야기다. 소설은 공사현장에서 데스마스크가 발견되면서 시작한다. 그것을 소설의 화자인 ㄱ이 대학 시절 선생님께 전한다. 하여 소설은 일기나 편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혼 후 고향 ‘소소’로 돌아온 ㄱ은 혼자 생활한다. 자유롭게 혹은 고독하게 생을 즐긴다. ㄱ 앞에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남자 ㄴ이 등장한다. ㄴ에게 방을 내주면서 ㄱ의 삶은 생동감이 넘친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 더플백 하나만 소유한 ㄴ은 ㄱ의 집에서 우물을 판다. 마치 자신의 관을 향해 나아가듯. 그럼에도 ㄱ과 ㄴ은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둘 사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든 촉매제 같은 ㄷ이 온다. 갓 소녀에서 벗어난 어린 여자. ㄱ이란 언니와 ㄴ이란 아저씨가 생겨 마냥 기쁜 ㄷ. 둘 사이를 끊고자 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를 이어 더 긴 끈을 만들기를 소망한다. 한 남자 ㄴ과 두 여자 ㄱ, ㄷ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사랑이었고 생에 대한 욕망이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 설사 설명한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없는 관계다.
ㄱ, ㄴ, ㄷ의 이야기를 차례로 저마다의 삶을 들려준다. 온전한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와 결혼했지만 언제나 목마른 사막처럼 살았던 ㄱ, 자신의 존재를 경멸하며 부랑자로 살며 노래를 품었던 ㄴ, 죽음을 동경하지만 죽음이 아닌 생을 선택한 ㄷ.
‘셋으로 삼각형을 이룬 게 아니었어요. 셋으로부터 확장되어 우리가 마침내 하나의 원을 이루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역동적이고 다정한 강강술래 같은 거요. 둘이선 절대로 원형을 만들 수 없잖아요. 셋이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한 원형이지요.’ 209쪽
정확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세 사람이 포개진 표지처럼 기묘한 이야기다. 소설 속 표현대로 셋은 ‘덩어리’가 되어 사랑을 나눈다. 덩어리는 셋이 아닌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하나가 된 셋의 풍경은 곧 사라진다. 우물이 완성되고 그 우물에 ㄴ이 빠져 죽었기 때문이다. 우물은 메워졌고 ㄷ은 사라졌다. ㄱ도 집을 떠난다.
셋은 분명 서로를 사랑했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러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감정이고 우리네 생이다. 박범신은 소설을 통해 그것을 보여준다.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이런 생이 존재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풍경의 일부라는 걸 말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