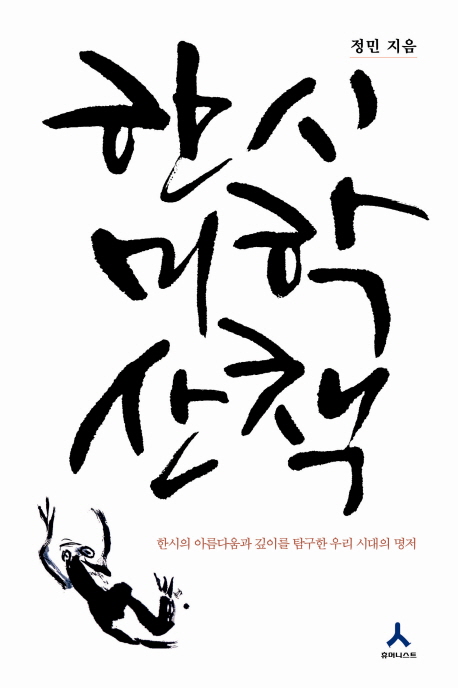
[북데일리] [강추] 한시. 아무리 쉽고 짧다해도 눈여겨 보는 이가 없다. 고전, 나아가 책보다 더 소외받는 장르다. 여기엔 언어 자체의 문제가 가장 크지만, 그 뜻을 쉽게 전해주는 '미디어' 부재 역시 작다할 수 없다.
정민 교수는 '한시가 정말로 골동적 가치만 지닌 퇴영적 문화유산에 지나지 않은 걸까?'라는 의문을 품은 끝에 <한시미학산책>(2010. 휴머니스트)을 내놓았다. 요리사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
한시는 지금은 '찬밥'이지만 선인에겐 문학이자 철학과 예술이었다. 옛사람들은 시를 지을 때 '눈에 상처를 내고 가슴을 찌르듯' 하였을 정도로 혼신을 다했다. 글 자 한자 넣기 위해 고민했고, 좋은 시 하나를 얻기 위해 다난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당나라 천재 시인 이하는 매일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밖에 나가 시상을 떠올리고 시를 썼다. 매일 그 작업을 한 끝에 스물일곱의 나이에 요절했다.
고려 때 강일용은 백로를 가지고 남이 생각하지 못한 시 한 수를 지으려고 100인간 관찰했다. 그러다 단 한 구절을 얻었다.
'푸른 산 허리를 날며 가르네. (飛割碧山腰)'
또한 시의 짝을 맞추기에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한 선비는 낮잠을 자다가 소나기가 연꽃 화분을 후득이며 지나는 소리에 잠을 깨어 시구 하나를 얻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났도록 시에 걸맞는 짝(대구)을 찾지 못한 채 죽음을 맞았다. 외기러기 같은 그 시는 다음과 같았다.
'연잎 쏟는 빗소리에 꿈 서늘터니. (夢凉荷瀉雨)'
시를 짓다보면 '시마'(詩魔, 시 귀신) 들리기도 한다.
'길을 가면서도 시 생각, 밥을 먹으면서도 시 생각, 심지어 꿈에서까지 시 생각뿐, 그밖에 다른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지는 증세, 예의와 염치, 체모조차 우습게 보는 태도, 눈에 띄는 사물마다 허투루 보지 앟고 거기에 담긴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달려드는 증상이 이른바 시마증후군이다.' 269쪽
그러나 시마는 시인에게 즐거운 손님이다. 정민 교수 책을 통해 '집필 중에 시마에 걸린 듯 했다'고 토로했다.
책을 읽다보면 한시의 종류가 참 많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를테면 '오도시'(悟道詩)라는 게 있다. 송나라 어느 비구니가 지은 시다. 도를 깨달은 순간의 법열을 노래한 시다. 또한 글자로 탑을 쌓은 '층시'(혹은 보탑시)가 있다. 내리읽거나 치읽어도 뜻이 통하는 '회문시'도 있다.
사물을 관조하며 노래하는 '관물시'에 이르면 시는 철학이 된다. 시인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이치를 살펴 통찰에 이른다. 놀라운 깨달음의 세계다. 이 쯤되면 시는 '선시'가 된다. 책엔 그 한 사례로 유재영의 '오월'을 소개한다.
상추꽃 핀
아침
자벌레가
기어가는
지구 안쪽이
자꾸만
간지럽다
시에 사랑이 빠질 수 없다. 이른바 정시(情詩)다. 강세황(1713~1791)은 어여쁜 처자의 뒷모습에 마음 빼앗겨 뒤를 쫓다가 '다정할사 잔설이 그대로 남아 있어 / 그녀의 발자국이 담장 가에 찍혔구나'라고 시를 읊었다. 그런가 하면 이명한(1595~1645)은 애타는 그리움을 '나는 꽃은 어지럽고 봄날은 꿈 같은데 / 슬프다 방주에 가신 님은 안 오시네'라고 묘사했다. 한시를 구성지게 풀어내는 저자의 솜씨가 반짝인다.
한시 해제의 문학성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다. 저자는 현실인식이나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미학과 미의식이 없는 낡아빠진 한시연구를 비판한다. 죽은 한시에 신선한 호흡을 불어넣는 일, 그 현대적 의미를 새롭게 밝히는 일이 이 책을 쓴 취지다. 그에 모자람이 없다. 강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