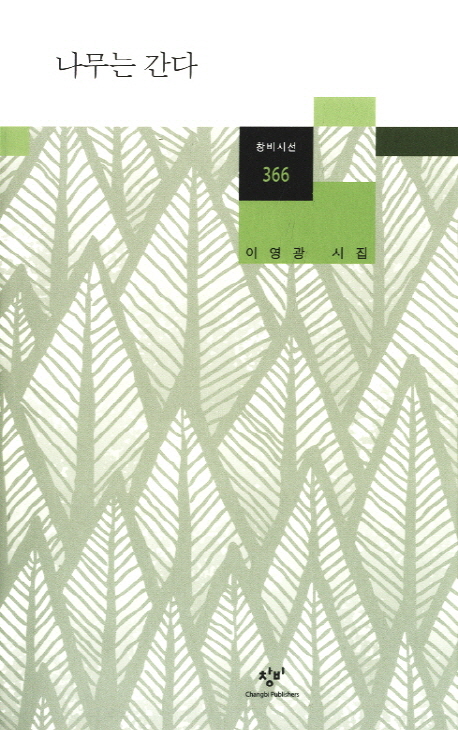
[북데일리] 사람이 생각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는 사회적 동물이라면 만물과 교신하며 암호를 시로 푸는 사람을 시인이라 한다. 김 영광 시인의 네 번째 시집<나무는 간다> (창비. 2013)는 사람의 고독과 사랑을, 시인의 긍지와 겸손을 담아 여러 갈래의 길을 제시한다. 문장 표면에 보이는 길과 행간에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가 보자.
"오일장에선 모두가 곱게, 미친 것 같다/ 뭘 팔고 사러 모여드는 난전에, 사는 게 대체 무언가/ 도합 십 만원이 안 되는 좌판들은 저승꽃들은/ 온종일 냉이며 쪽파 다듬고/ 헐벗은 계산속으로/ 기장이며 팥이며 서리태에, 이름도 모를 곡식들을 되면서도/ 깍아 주면서도 신이 난다/ 흥정은 엄숙한 것이다./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의 발버둥이었지만 오일장에 아예 발버둥이 없다 때 절은 전대와 목장갑 낀 손과/ 불쑥 고무장갑이 된 손에/ 여념 없는 집중이 끓는다/ 뼈가 다 보일 듯 뼈로 지핀 듯 고요한 불꽃이 탄다"('오일장 ') 부분
오일장 풍경은 느리게 가는 시계같다. 시인은 누구하나 악착같이 발버둥 치지 않는다지만 삶은 소리없는 아우성이 아닐까. 언제고 자루속 송곳처럼 그 정체를 드러내고 말테니까.
"세상이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사실이 위로다/ 집 팔고 세 얻어 휴일에 이사하는데/ 동네에서 동네로 옮겨가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중략) 집을 잃었지만/ 집이 무기인 시절에/ 십년 면벽이 희망 익스프레스에 실려 가는 걸/ 대낮의 아파트만 천개의 눈을 뜨고/ 멀뚱멀뚱 내려다 본다/ 투명 이불 투명 책상 투명 바가지 투명 옷/ 야반도주 하십니까/ 훔치는 중입니까, 물어주길/ 바랐지만, 바라려고 애썼지만/(중략) 괜찮다, 새 집엔 빈 벽이 많다/ 사라진 짐들은 밤이면 나타나리라/ 나도 나타나리라/ 장물아비처럼 낯선 거실에 앉아/ 투명 소주를 마신다"('투명')부분
어쩌면 '피로사회'보다 불안한 게 '투명사회' 가 아닐까.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누구하나 알은 체 하지않는 것에서 위로가 된다했다가 새 집에 빈 벽이 많다는 말에 고독과 투명소주를 거론한 걸 보면 뭔가 할 말이 있나보다.
"역도 선수는 든다/ 비장하고 괴로운 얼굴로/ 숨을 끊고/ 일단은 들어야 하지만/ 불끈 들어올린 다음 부들부들/ 부동자세로 버티는 건/ 선수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희한하게/ 힘이 남아 돌아도 절대로 버티는 법이 없다/ 모든 역도 선수들은 현명하다/ 내려 놓는다/ 제 몸의 몇 배나 되는 무게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텅!/ 그것 참, 후련하게 잘 내려 놓는다/ 저렇게 환한 얼굴로"('내려놓는다') 전문
시인은 역도를 비장하게 들어 올리는 힘의 논리에서 빗겨가 후련하게 내려놓는 법을 말한다. 삶은 들어올리기보다 때로는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면 슬픔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넌지시 귀띔해 주는 듯하다.
"슬픔도 도적처럼 다녀간다/ 잡을 수가 없다/ 몸이 끓인 불/ 울음이 목을 꽉 눌러 터뜨리려 하면/ 어디론가 빠져 달아나 버린다/ 뒤늦은 몸이 한참 젖다 시든다/ 슬픔은 눈에 비친 것보다는 늘/ 더 가까이 있지만/ 깨질 듯 저를 잊은 어느 황혼/ 방심함 고요의 끝물에도/ 눈가에 슬쩍 눈물을 묻혀 두고는/ 어느 결에 사라지고 없다/ 슬픔이 와서 하는 일이란 겨우/ 울음에서 소리를 훔쳐내는 일."('슬픔이 하는 일') 전문
시는 8할이 사람과 시인 이야기다. 평범하기도 하고 비범하다. 묘사와 진술로 버무려 풍성하다. 다소 난해하기도 하지만 음미하는 맛도 있다. 시 읽기의 묘미다. 시편마다 그림으로 보여주다가('오일장','내려놓는 법') 마지막 진술('우물','슬픔이 하는 일') 장면에서는 행간에 오래 머무르게 한다. 시인이 말하는 이 시처럼.
"모든 말을 다 배운 벙어리/혀 잘린 변사/ 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시인이여, 젊어 늙는다/ 사랑 없는 사실 앞에 조아리고 앉아/ 어서 목을 쳐주길 기다리는/ 사랑처럼/늙어서도 힘내어 젊는다."('시인이여') 전문
<장맹순 시민기자>


